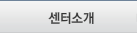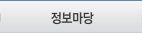| 제목 |
인도, 경영환경 지속 개선으로 제2의 베트남 시장 가시화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통합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3-2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 |
|
조회 | 1329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인도, 경영환경 지속 개선으로 제2의 베트남 시장 가시화 - 세계 2번째 인구, 세계 6대 경제 규모, GDP 성장률 7%의 유망시장 -
□ 인도로 몰리는 외국 기업들
ㅇ 전 세계 외국인투자(FDI)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인도 FDI는 증가세이며 M&A 투자 규모는 중국을 넘어섬.
- 2010~2014년 200억 달러(누적)에 머물던 대인도 FDI는 2015년 이후 약 400억 달러로 증가 중
- 2013~2014년 기준 대인도 M&A 투자 규모는 125억 달러 규모로 대중국 M&A 투자 규모의 약 14% 수준에 불과했지만, 2017년 227억 달러를 투자받아 대중국 투자 금액(83억 달러)을 크게 상회
ㅇ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격차가 큼. - 2018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8억 달러를 돌파
- 2000년 4월~2018년 12월 누적기준 인도의 전체 FD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.87%로 미국, 일본과는 각각 5.18%p(약 212억 달러), 6.34%p(약 259억 달러)의 격차가 존재함.
국가별 대인도 FDI 누적 비중
(단위: US$ 백만, %)
주: 2000년 4월~2018년 12월 누적기준
자료원: 인도 산업정책진흥국(DIPP)
ㅇ 분야별 FDI 유입동향 - 2000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액 기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17%로 가장 많으며 컴퓨터(9%), 통신(8%), 건설(6%), 무역(5%), 자동차(5%) 순임.
- (한국) 철강, 화학 강세, 투자 진출 효과로 기계류 수출 증가
·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으로 한국, 일본 철강업체들이 판로를 변경함. 대인도 철강 수출이 크게 확대됐으며 전방산업의 확장으로 PVC를 중심으로 화학제품의 수출 또한 늘어나고 있음.
· 기아자동차는 최근 안드라푸라데시주 아난다푸르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함. 이에 따라 생산설비,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기계류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.
ㅇ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와 산업고도화 진행에 따라 관련 첨단 서비스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.
- 최근 5년간 서비스산업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, 통신, 전자상거래,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함.
- 특히 2016~2018년 외국 기업의 인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판매·유통 기업에 대한 M&A는 24건으로 투자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80% 이상(거래금액 기준)이 미국에 의한 투자임.
분야별 FDI 유입 현황
(단위: US$ 백만, %)
자료원: 인도 산업정책진흥국(DIPP)
□ 인도의 글로벌시장 수출 기지화 육성 전략
ㅇ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공장 지향
- 모디 정부는 2022년까지 제조업의 GDP 기여율을 현재의 16%에서 25%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‘Make in India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- 세부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외 기업의 제조공장을 인도로 유치하는 것임.
Make in India 육성 제조업
자료원: Make in India
□ 인도 비즈니스 환경은 베트남과 비슷, 시장 규모는 10배 이상
ㅇ (비즈니스 환경)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으로 베트남과 차이가 미미함.
· 인도: 순위 77위, 점수 67.23(직전 평가 대비+6.63p 상승)
· 베트남: 순위 69위, 점수 68.36(직전 평가 대비+1.59p 상승)
· 중국: 순위 46위, 점수 73.64(직전 평가 대비 +8.64p 상승)
ㅇ (인건비) 제조업 평균 임금이 베트남보다 13% 가까이 저렴
- 벵갈루루 인근 섬유공장 생산직 초임은 약 130달러/월, 경력직은 186달러/월 정도
- 중국 대비 제조업 평균 임금은 1/3 수준
ㅇ (한국 기업 진출) 인도 진출 한국 기업 수는 500여 개사에 불과하며 중소·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진출
· 대인도 진출 일본 기업 vs 한국 기업 수: 1441개사 vs 500개사
· 삼성전자, LG전자, 현대차, POSCO, 기아차, 두산, CJ 등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위주 진출
ㅇ (GDP 성장) 인도는 베트남, 중국보다 높은 7% 성장률 시현
- 인구가 13억 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%대 고성장을 보이는 경제는 인도가 유일
- 평균 연령도 29세에 불과해 노동력이 풍부하고 내수 소비시장도 성장 전망
ㅇ 포스트 차이나, 13억 인구의 잠재력을 담은 인도
- 중국과 다르게 수출 주도 성장보다 내수 위주 성장을 지향해 선진국 수출시장 침체에도 크게 위협받지 않음.
- 인도는 세계 3위권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‘세계의 공장’을 지향하고 있음.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향한 교두보가 될 것
인도 , 베트남 , 중국 비교표
자료원: Payscale, KIEP, ILO, Willis Towers Watson, IMF, World Bank
□ 인도 비즈니스 환경은 빠른 속도로 개선 중
ㅇ 모디 정부는 대부분 분야에서 FDI 100% 자동승인을 허용했음.
- 2017년 8월 28일 기준으로 농업·축산업, 제조업, 건설업, 민간항공, 무역 등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한도 규제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FDI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2018년 1월에는 49% 초과 시 정부승인이 필요했던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부문에 대해서도 100%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추가 완화함.
ㅇ 인도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.
-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(Ease of Doing Business)에 의하면 2017년 60.6점에서 2018년 6.63점 증가한 67.23점을 기록함. 2017년 100위에서 2018년 77위로 급상승하며 서남아 내 1위로 괄목할 만한 개선 시현 · (2018) 베트남 69위, 중국 46위
ㅇ 인도 정부 노력으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나 비즈니스 개시, 조세 등이 여전히 어려운 분야
- 조세는 2017년 통합간접세(GST, Goods and Services Tax) 도입 이후 개선되고 있는 상황
인도 비즈니스 환경 순위
자료원: World Bank ‘Doing Business Report’(전체 190개국 평가)
ㅇ 비즈니스 환경 우수 지역은 안드라프라데시, 텔랑가나주 등임. · (안드라프라데시) Ease of Doing Business 1위, 기아차 인도 진출 거점, 아난타푸르 · (텔랑가나) Ease of Doing Business 2위, 의료바이오·섬유·IT 허브
인도 주별 투자환경 순위
자료원: 인도 상공부(Business Reform Action Plan 2017 홈페이지)
□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시기
ㅇ (전문가 코멘트) 신남방 지역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서 대인도 투자 확대 필요
- PWC의 파트너 Mohammad Athar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은 2025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FDI 또한 지속해서 유입될 전망
- 신규 투자는 통신, 식품 가공, 자동차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 분야의 성장 및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ㅇ (투자 진출 분야) ICT,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첨단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분야를 고려해볼 것
- 인도 정부는 ‘Make in India’ 정책을 통해 육성산업으로 내세운 IT·통신기기, 신재생에너지, 의료바이오, 방위, 우주항공 분야 등의 첨단 분야를 제시
- 전반적인 모든 제조업 분야가 열악하므로 첨단 분야 이외의 제조업도 유망한 투자진출 분야로 판단
ㅇ (이전 추진시 최적지) 특히 중국, 베트남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한계 기업은 이전 검토 시 인도를 제1의 투자대상지로 고려 필요
-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산업을 중심으로 인도 내 생산거점을 구축해 상품 경쟁력 확보 가능
- 동시에 인도 내수시장 공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,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신규 개척이 가능
자료원: KOTRA 해외시장뉴스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